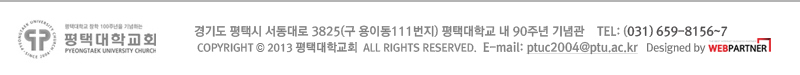순교자 문준경 전도사 생애(2)
문준경은 첩이 남편을 차지하였지만, 그녀를 ‘작은댁’이라고 불렀다. 얼마 후 작은댁 소복진이 아이를 가지게 되자, 그녀를 정성껏 돌보았다. 작은댁의 출산을 도와 자기 손으로 아이를 받았다. 문준경은 태어날 때부터 약했던 이 아이를 마치 자기 자식 인양 최선을 다해 돌보았다. 문준경의 이 모든 지극 정성을 지켜 본 큰 시숙 정영범 씨는 문준경에서 감탄하면서 고맙고 또 고마워했다. 그리고 큰 시숙은 그 아이의 이름을 “제수씨의 이름 성(姓)과 제수씨의 마음을 합해서 문심(文心)이라고 지었다”.
이런 문준경에게 또 하나의 시련이 왔다. 그동안 자기를 그토록 아껴주고 자기 편이 되었던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이다. 그녀의 슬픔은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이상으로 컸다. 문준경은 시아버지 3년 상을 치르고 시어머니를 모시게 되었다. 그리고 큰 시숙 정영범 씨의 아들 태진이를 어머니처럼 보살펴 주었다. 그러나 양아들과 같은 태진 군이 서울에 취직하여 가게 되자 더 이상 증도에 있을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 자기 곁에는 남편도, 아껴주시던 시아버님도, 마음을 쏟은 문심과 태진이, 아무도 없었다.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졌다. 문준경은 친정 부모님이 그리웠다. 그렇다고 고향 암태도 친정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다. 결혼한 여자가 다시 친정으로 돌아올 경우,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릴 모습은 상상하기도 싫었다.
문준경의 상황을 알고 있는 친정 오빠의 조언에 따라, 문준경은 목포에 와서 큰 오빠가 운영하는 숙박업소 근처에 자리를 잡았다. 가족의 도움으로 목포에 거처를 마련한 문준경은 이 단 칸 방에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을 곰곰이 생각했다. 무엇인가 매일 해야 할 일을 생각하던 중 어렸을 때 익혔던 바느질이 떠올랐다. 어머니를 도우면서 익혔던 바느질, 시댁에 있을 때, 바느질로 옷을 만들어 시장에 팔았던 일도 있었기에 삯바느질은 해 볼 만한 것이었다. 문준경은 단 칸 방에서 삯바느질을 시작했다. 그녀의 바느질 솜씨에 손님은 끊이질 않고 계속 이어졌다. 재봉틀로 옷을 수선하고 누비옷도 만들어 팔았다. 그러면서 단골손님도 생겼다. 그러나 홀로 지내는 깊은 외로움은 하는 일을 통해서도 해소될 수 없었다. 남편이 있지만, 둘째 부인과 살고 있어 자신은 홀로 있는 생과부 같은 신세였다.
이번에 북교동교회 세례인 명부(名簿)를 통해 그동안 여러 가지 설이 있었던 문준경의 구도와 세례에 관한 확실한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다. 김안헌(金安憲)이라는 목포(북교동)교회 신자가 1927년 5월 1일 전도하여 교회에 등록하게 했다. 이 때 그녀의 나이 36세 때였다. 장석초 전도사가 목회하던 때였다. 1927년 5월 14일 전성운 목사에게서 학습을 받고 1928년 4월 23일 전성운 목사에게서 세례를 받았다. 슬픔과 좌절 속에 있던 그녀에게 기독교 신앙은 새 힘을 주고 희망을 주었다. 당시 목포교회는 대전지방 소속 교회로 전성운 목사는 대전지방 감리목사였다. 문준경은 교회에 출석한 지 얼마 안 되어 십자가의 구원을 받았다. 구원받자 곧 장석초 전도사의 압해도 개척을 도우며, 때로는 목포 한쪽을 떼여 맡아서 개인 전도를 하였다. 이때가 장석초 전도사가 목회하면서 압해도에 교회를 개척한 1928년이다. 교회 출석한 지 1년밖에 안 된 신자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 안에서 성령님께서 살아 계셔서 복음 전도의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녀는 평신도였지만 여전도사의 역할을 도맡아 한 것이다.
문준경은 예수님을 믿고 삶의 방향과 삶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 한탄과 절망의 늪에서 기쁨과 소망을 맛본 것이다. 성결교에서 말하는 온전한 성결인이 된 것이다. 목포교회는 문준경이 이제까지 겪었던 좌절과 인생의 쓰라린 상처를 보듬어 주는 어머니 역할을 해주었다. 무엇보다도 장석초 전도사의 해박한 성경 말씀은 문준경이 난생 처음 경험하는 신세계로 인도하였다.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변한 문준경의 생활은 기쁨으로 넘쳤다.